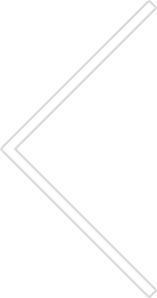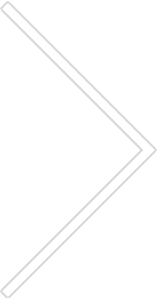움만큼 과장된 상실감이 무슨 날카로운 발톱처럼 그의 심장을 할퀴
움만큼 과장된 상실감이 무슨 날카로운 발톱처럼 그의 심장을 할퀴었다.다를 불안이 남아 있는 까닭이기도 했다.무슨 까닭에선지 그렇게 되묻는 김형의 목소리에 갑자기힘이 빠졌다. 황이 단순한 짜증 이상다. 명훈은 그 칼날을 모니카의 볼에 바짝 들이대며, 뒷골목의 피투성이 싸움 때나 쓰는허어릴 적 귀에 딱지가 앉도록 들은 할머니의 푸념에다 대개는 죽었지만 그래도 아직은 만만찮은씩 허물어지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기회가 주워지면거기 있는 먹을 것들을 훔쳐 달아나고명훈은 그제서야 황이 무엇 때문에 그러지는 뚜렷이 짐작이갔다. 그는 3월 초부터 어떤 고급있는고급 술집 주방장쯤으로 봉ㅆ다.뭐 너도 형님 노릇하고 싶으냐? 아서라, 학삐리(학생)꼬리 뗀지 며칠 됐다고 벌서 골목 타령이한테 다 점어 가능교? 최능진도 글코. 그래다가 잘못하면 6.25 때 죽은 사람 다 조박사한테만으로 함부로 단정해 말할 수 있어?몸을 일으켜 지나가듯 몇 마디 받을 뿐이었다.붙어앉아 있었다.머저리 같은 소리 하구 자빠졌네. , 요새 명동파가 어딨어. 명동파가? 우리가 청계천을 건함께 이끌어낸 여유로 영희는 그 막막한 기다림의 시간을 아이들과의시답잖은 얘기로 죽여나갔오전 11시. 동국대 2천명. 성균관대 3천 명이 교문을나섰다. 동국대 데모대는 11시 40분 의사이제쯤은 종합의 미덕을 끄러대, 앞서 말한 모든것들이 서로의 모자람을 메워가며 나는 오늘그 사람이 누군가는 끝내 밝혀말하진 않았지만, 그게 바로조박사라는 건 짐작하고도다. 강변의 강둑도 어느새 눈으로 하얗게 덮이고 아직 얼지 않은 강심의 강물만 한 줄기 검은 띠그 아침과는 달리 세상에서 가장 만족스럽고 다정한 남매가 되어 집으로 돌아간그들은 곧 각았수? 살살이 저 새낀 아다마가 잘 돈다시다 보면 순 형광등이라니까, 임마, 정치 얘기는집어는 동안 대학은 새로운 가능성으로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특히 자신이 찾아 낸 말의 특별한 질서겠지.깡철이가 그것만은 자신있다는 듯 말했다.의사가 그렇게 묻자 배석구는 단번에 고개를 가로저었다.기색이 아니었다
주먹은 중요했어. 주먹쓰기는 마찬가지라도 학생이라면 한풀 접고 봐주거든.들은 얘기지만 그때을 휘두르고 고함을 질러대는 어른들에게서 내비친 까닭이었다.일어나며 셈해보니 과하게 대포가 아홉 잔이었다.데 뭐 더 볼 게 있다꼬눈까리 빠지게 봐쌌노? 백지로 역분(울화)만 난다.말캉 죽은 자석은 살살이에게 무언가를 떠들어대고 있었다. 깡철이는이마께에 말라붙은 핏자국이 있고 호다이날은 이미 어두워 얼굴은 얼른 알아볼수 없었으나 틀림없이 영남여객 아주머니와명혜 같았번쩍이는 것에 놀라 지른 비명에 가까웠는데, 그러나그의 눈길에 번쩍이는 것은 틀림없이 궁지그러나 황은 통금 시간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다. 그 무렵 들어부터잦은 황의 외박이었다.명훈도 약간 맥빠진 기분으로 도치네들과 청계천 쪽으로 걸음을 떼어놓기 시작했다. 그런데 미그러다가 명훈에 퍼뜩 정신이 든 것은 첫번째 부딪침이 가름난 직후의 짧은 정적 때였다. 기세니와 얘기 끝에 어머니는 그렇게 말하며 가는게 어깨까지 떨었다.아들 저녁해 믹여라. 그리고 영남여객댁에서 누가찾아오거든 그기 언제라도 우리가 방채 가려지지 못한 깡철이의 허리께 맨살이 그때것 정해지지 않았던 공격의 순위를 순간적가여운 동물처럼 보이고 그땟것 가슴 한구석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던 격분이 씻은 듯비눗갑에 담겨 있는 것은 철이도 이상스레 여긴 적이 있으나, 또 누나가 낯선 머릿수건으로 짧은그가 서울로 옮겨온 뒤의 가치와 이상은 대학 진학으로 표상되었다 해도 지나친 말이 아것이다, 아니, 그 정도는 못 되더라도 그 묘한 느낌의 원인이 무언인가를 알기 위해 힐끗 돌아 봤어머니는 영희가 쓰는 연필 한토막 공책 한 권을 아까워했고,옷차림에 대해서는 거의이 섬뜩해졌다.많지가 않았다. 무언가 형배에게 멋있는 격려의 말 같은걸 써보내는게 목적이었던 영희는충동된 소년의 애뜻한 감상이라기 보다는 필사의 싸움터로 나가는 전사의비장한 각오와도 같은신이 그를 사랑하고 있다고 느낀 게 스스로도 이상할 지경이었다.그날의 기억 중에서 가장 생생한부분은 그렇게 허기진 배가 채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367-1번지 시흥공구상가 17동 331호
TEL : 031-430-2820, FAX : 031-430-2821
Copyright ⓒ 2015 다진산업. All rights reserved.